에밀 졸라의 <집구석들>. 졸라가 개척했다는 자연주의 문학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물론 졸라의 책도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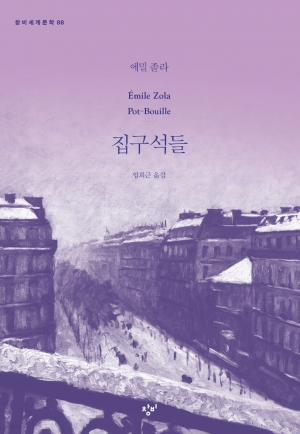
졸라는 19세기 프랑스 파리 어느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중산층 부르주아들의 민낯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회를 즐긴다. 연회에서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에 대한 얘기들이 오간다. 그러나 그런 우아한 모임이 끝난 후 그들은 틈만 나면 이웃집 남자나 여자와 들러붙는다. 그들에게 고용된 하녀들은 주인들이 데리고 노는 창녀들이나 다름없다. 부르주아들의 모든 관심은 돈과 섹스에 몰려 있다. 이웃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사는지 아는 그들은 서로를 경멸한다. 그러면서도 모이면 격식을 갖춘 우아한 말을 주고받으며 피아노 반주에 맞춰 멋진 노래를 부른다.
그들을 교구민으로 둔 사제는 그들의 위선을 알지만 모른 척 눈을 감는다. 사제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집례하고 때때로 고민 상담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타락한 브루주아가 사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사제가 나름 활용가치가 있고 그들의 삶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설 말미에 사제는 이렇게 탄식한다. "사제들마저 부패시키는 이 말세의 한가운데서 저는 무엇을 하오니까?" 하지만 탄식은 탄식일뿐 그는 부르주아들 틈에서 '그들 중 하나'로 사는 것 외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중산층 시민들의 위선적인 삶 곁에서 그들의 욕받이와 성욕 처리 대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각 집에 고용된 하녀들이다. 소설은 자주 빌라의 세입자인 부르주아들이 이용하는 말끔하고 고즈넉한 중앙계단과 하녀들이 이용하는 어둑컴컴한 시궁창 같은 뒷계단을 비교한다. 소설 속에서 두 계단의 겉모습은 계속해서 비교된다. 하지만 그 둘은 그것을 이용하는 이들 모두가 추악하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600쪽에 이르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쥘리라는 하녀가 하는 말이다. "요즘은 이 집 것들이나 저 집 것들이나 매일반이라니까. 돼지 같은 족속들이지 뭐."
소설은 독자에게 그 어떤 멋진 서사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교훈도 전하지 않는다. 그저 파리의 중산층 시민들의 낮과 밤을 지루하게 묘사할 뿐이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런 책을 왜 읽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으나, 묘하게도 마치 끌려가듯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었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하는 것. 문학에는 그런 효용이 있는 것 같다. 도서관에 졸라의 책들이 꽤 있다. 더 읽게 될 것 같다.
김광남
종교서적 편집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작가이자 번역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교회 민주주의: 예인교회 이야기>, 옮긴 책으로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하여: 본회퍼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