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터라고 했다. 큰 국솥에는 500인 분의 국물이 끓어오르고 튀김 솥에는 옷 입힌 고기 덩이가 기름처럼 우글거린다. 가끔 그것들이 맨 살로 튀어 오를 때면 어디선가 짧은 비명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쌓아 놓은 재료와 설거지 더미 사이를 콩닥거리며 뛰다가 부딪혀 시퍼런 멍이 몸 사방으로 들기도 한다. 칼과 가위 같이 날카로운 것들은 가끔 무기가 되어 상처를 내기도 하고 온 종일 전만 부치는 날에는 바닥에 기름이 튀고 문질러져 미끄러지기 일쑤다.
배수구 뚜껑이 제대로 안 덮혀 발이라도 빠지면 큰 사고가 일어나고 음식 재료를 담은 무거운 통이 발등에 떨어지거나 무게에 못 이겨 손을 찧기도 한다. 독한 세제가 손톱을 갈라놓고 피부를 짓무르게 하기도 하고, 눈으로 얼굴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해한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무기는 사람 안에 있다. 메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로 짜여 진 날이거나 한 그릇 음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미리 재료들을 그릇에 셋팅까지 해 두어야 하는데 그러면 한 시간 전부터 사람들은 시간에 쫓겨 아주 많이 예민해진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한 양을 적당하게 나누어 담도록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기계가 되어 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어떤 사람이 손이 느리거나 또 어떤 사람이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재료 배분을 못 해 재료 한 가지라도 일찍 소진해 버리면 온 몸으로 욕을 폭탄처럼 받아내야 할지도 모른다. 다른 방법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된 밥시간에 맞추어 밥이 나가야 한다.
이 곳은 일하는 시간대가 다르게 배정 되어 있다. 각자 자기 시간에 합류해서 눈치껏 일을 찾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날은 메뉴가 비빔밥이라 긴박한 셋팅 속에 늦게 합류한 한 분이 손이 안 보이도록 일을 하시다 말고는 “슬아, 니 그러다 올라가야 된다.” 하신다. 이 분위기에서 당연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고 “네에? 저 어디 가요?” 했더니, 나만 모르고 다 한바탕 웃는다. “니 그렇게 재료 많이 쓰다가 손님 밥상에 니가 올라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제서야 알아듣고는 “악 이모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한다. “그리로 안 올라 갈라믄 딱 맞게 넣어라. 나도 안 올라 갈라꼬 기를 쓴다.”

작은 피자를 만들던 또 다른 바쁜 날에도 늦게 합류한 이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오븐 그릇에다가 마요네즈를 휘휘 열심히 바르신다. “어어 이모 그게 아닌데... 그릇이 아니고 빵에다 바르셔야 하는데...” 한순간에 모두가 입을 딱 벌리고 하던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니들한테 어대다 바르냐고 했디만 자꾸 바닥이라고 카고 바닥에다가 이걸 바르나 케도 또 그렇다 카길래 이렇게 하면 뭐가 더 맛있나 싶어서 나는 또 무신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제.” 정적을 깨고 모두의 웃음이 빵하고 터진다. 피자 빵 바닥이라고 하는 것을 그릇 바닥에 바르라는 줄 알고 순간 심각하게 고민 하셨을 모습에, 그것을 또 결국 그릇에 발라 버리면서 깊은 뜻일 거라고 하는 이모의 엉뚱함에 그 뒤로도 마요네즈만 보면 그릇에 예쁘게 발려진 마요네즈 생각에 웃음이 마구 삐져나온다.
기계 소리에 파묻혀 너무 시끄럽고, 시간을 맞추려 너무 바쁘고, 그 속에서 서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는 가끔은 탑을 올리라는데 내리고 내리라는데 올리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어리석은 인간들 같았다. 하지만 가만 보니 바벨탑에서도 유머가 있고 엉뚱함이 있고 웃음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던 길에도 하느님은 노하기만 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에게 분명 그릇에 발린 마요네즈 같이 끈끈하고 고소한 웃음의 기억들을 두고두고 허락하셨을 것 같다.
밥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시간쯤이면 아주머니들은 서로 먼저 가겠다고 난리가 난다. 어디를 자꾸 가시느냐 하니 아까부터 참았다고 한다. 나는 아까 아까부터 참아왔다고 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조리사님이 “그러면 나는 벌써 바지에 싸버렸다.” 하니,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되어 깔깔 거리고 웃는다. 소변 마려워서 난리난리 하는 소리가 너무 웃기고 너무 슬프다. 화장실도 가고 싶을 때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 곳을 두고 아주머니들은 "바로 여기가 전쟁터"라고 했다.
날마다 전쟁터 같다던 이 곳에서도 웃음을 주고받는다. 도대체 언제 전쟁이 끝나느냐고 하면서도,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주 보고 더 크게 웃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한바탕 웃고 나면 긴장감이 녹아내린다. 긴박하고 불안하고 가장 힘든 상황일수록 서로의 웃음은 인간을 더 아름답고 돈독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았다. 늘상 일에 치여서 토닥거리며 싸우다 투덜거리고 불만하고 잔뜩 예민해져서는 화내고 토라져 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방이 떠나가라 함께 웃고 있는. 아 나 이거 참, 어떻게 하나. 사람사람 그렇게 징그럽다 하면서도 또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꾸만 좋아지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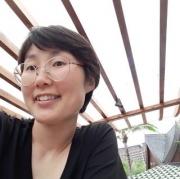
이슬 비아
세상에 온 의미를 찾아가는 촌스러운 이파리.
종이신문 <가톨릭일꾼>(무료) 정기구독 신청하기
http://www.catholicworker.kr/com/kd.htm
도로시데이영성센터-가톨릭일꾼 후원하기
https://v3.ngocms.co.kr/system/member_signup/join_option_select_03.html?id=hva82041


